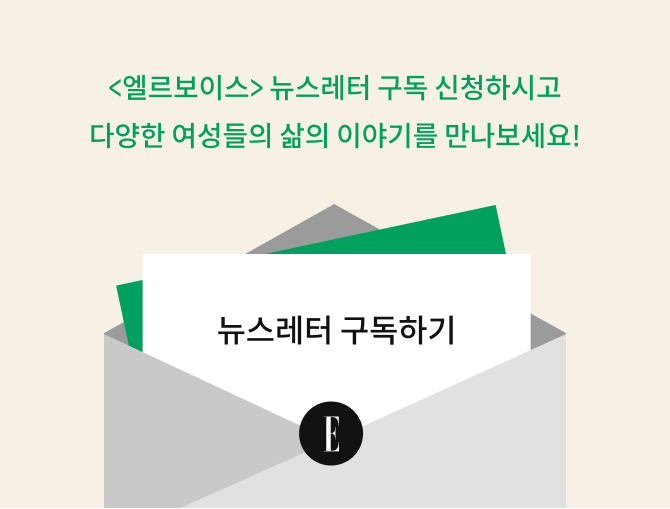[엘르보이스] 모든 엽서는 서울로 간다
2024.08.13

©unsplash
엽서나 편지를 잘 쓰지 않게 된 지 오래다. 글로 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마음이 이제는 많지 않고 그걸 손으로 적어 건네는 행위도 어쩐지 몹시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부터는 누군가의 손편지를 받는 것마저 고마우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서점이나 소품 숍, 기념품 가게 어디를 가도 엽서와 편지지는 넘쳐 난다.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 위에 마음을 적어 보내는 것을 즐기는 걸까? ‘이 엽서는 누구에게 쓸 테야!’ 같은 귀여운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돌아보면, 나도 누구보다 열심히 엽서를 썼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깨달았다. 애초에 나는 애틋한 마음을 꾹꾹 담아 엽서에 쓰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다. 내가 쓴 엽서의 대부분은 실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으니 바로 독자엽서다. 그것도 경품이 있을 때만! 처음은 당연히 만화 잡지였다. 2페이지에 걸친 애독자 선물 코너! 귀여운 벽시계나 액자, 동전지갑, 인형…. 지금 생각해 보면 잡지 편집자들이 동네 문구점에서 사온 것 같은 것 같은 그 선물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기껏해야 아이템당 당첨자가 한두 명 정도인 선물에 내가 당첨되는 일은 없었다. 내가 보낸 많은 엽서는 단 한 번, 아주 짧게 애독자 후기 페이지에 감상평으로 인용되는 데 그쳤다.

©unsplash
돌이켜보면 내가 썼던 모든 엽서의 주소지는 서울이었다. 수신인 자리에 썼던 주소가 하나하나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충남에서 나고 자란 내가 ‘한강로1동’나 ‘양천구’ 같은 지명을 알게 된 것은 아무래도 엽서를 써서 보낸 덕이다. 잡지에 애독자엽서나 정기구독 신청 페이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정확히 언제였을까? 비록 경품을 위해서였지만 종이 잡지를 사고, 엽서를 꾸미고,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어 보낸 뒤 다음달 잡지를 또 사서 내 당첨 여부를 확인했던 그 지난하고 복잡한 행위가 이제는 SNS 인증샷이나 팔로 인증 이벤트 정도로 끝나게 된 것도 느닷없이 섭섭하게 느껴진다. 이제는 누구도 편집부 혹은 방송국의 누군가에게 감상을 전하기 위해 엽서를 쓰지 않는 것처럼, 커뮤니티나 SNS에 누적된 댓글 반응이 사라질 날도 올 것이다. 문득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속 부발리니의 대사가 떠오른다. “저건 위성이야. 옛날에는 누구나 TV 쇼라는 걸 봤거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쇼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 그때까지는 일단 뭐든 써서 전하자.
Writer
이마루
콘텐츠 중독자. 쓰고 만드는 일 외에도 좋은 시민이 되려고 합니다.
Category
Credit
- 에디터 이마루
- 글 이마루
- 아트 디자이너 민홍주
- 디지털 디자이너 김민지